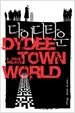 다이디타운
다이디타운F. 폴 윌슨 지음, 김상훈 옮김 / 북스피어
이번엔 장르의 방법론을 조금 언급하며 감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친우인 카방글의 감상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하드보일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챈들러)의 방법론에 대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설명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Seek and Find. "무언가를 찾아내려 했을 때, 찾아내려 했던 것은 이미 변질되었다." 하드보일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문구는 익숙하리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하드보일드의 매력인데, 타락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은 무언가를 찾아나섭니다만 찾아내었을 때 그것은 자신이 찾고자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주인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극복해낸다는 겁니다. 하드보일드 추리물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그를 죽였느냐?' 내지는 '그래서 진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변질되고 타락한 현실과 그 속을 살아가는 주인공,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극복해내는 모습입니다. 하드보일드에서 묘사가 중시된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이겠습니다: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드보일드는 나나 내 주변의 한두 가지 문제는 바꿀 수 있을지언정,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지는, 다시 말해서 세계 자체를 바꿔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드보일드가 기본적으로 세계의 강력함과 개인의 무력함을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챈들러의 필립 말로도, 해밋의 새뮤얼 스페이드도, 로스 맥도널드의 루 아처도,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의 일들을 겨우 처리해나갈 뿐입니다. 세계의 밑바탕에 깔린 불합리 자체를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데니스 르헤인의 켄지 & 제나로나, 미키 스필레인의 그 무작스러운 마이크 해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SF가 꼭 무제한적인 힘을 주인공에게 쥐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SF라고 해도 주인공에게 제법 제한이 걸리죠. 불합리를 바꾸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극복하고 마치는 SF도 얼마든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F와 하드보일드를 비교해보자면 역시 SF의 주인공이 하드보일드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왜 하드보일드와 SF를 굳이 비교하느냐? 그건 <다이디타운>이 하드보일드의 클리셰를 본격적으로 차용한 SF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전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만 한정한다면 전 이걸 거의 완벽한 하드보일드 SF라고 자신있게 말했을 겁니다. 젊은 여성의 의뢰를 받고,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는 와중에 점점 진실에 접근하고, 악당을 만나 기지로 해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전체에서 발생된 문제 하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주며 끝나죠. 더불어 SF다운 세계관 설정이 되어있어 흥미롭게 받아들여지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독자가 부담 없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잘 조합되어 있어 맛깔나죠. 아마 1부와 같은 느낌으로 2,3부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굳이 하드보일드와 SF를 비교해가며 감상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2부에서부터는 그 균형이 깨지고, 하드보일드다운 느낌은 꽤 사라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 잔향이 남아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같은데, 3부에서는 완전히 SF 쪽으로 기웁니다. 1, 2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취합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며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해결 방식이 '불합리의 해결'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세계의 불합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하드보일드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좀 많이 크죠. 어느 쪽이냐 하면 일반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라이맥스에 가깝습니다. 군중, 영웅이 된 주인공, 약간의 거래와 문제 해결. 박해받던 이들이 일어서고 드디어 그들이 그들을 억누르던 불합리를 바꿔놓는다. 읽으면서 '음, 하드보일드는 그만뒀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만큼 통쾌한 맛은 살아납니다. 단지 1부에서와 같이 하드보일드와 SF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끝나기를 기대했다면 2, 3부로 가면서는 좀 당황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라면 이런 느낌이죠: '어라? 기대했던 거랑 꽤 다른데. 그래도 뭐 재미있으니 괜찮지만.'
아무튼 전 이게 구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하드보일드든 SF든, 잘 쓰여진 수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좋아하셔도 즐겁게 읽힐 겁니다. 둘 다 좋아하면 더 좋고요.
보너스: 중요한 여자 주인공인 진 할로-c. (이름 뒤에 붙은 c는 클론임을 나타냄) 저는 그녀를 좀 팜므파탈로 보고 표범이나 고양이 같은 인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을 다 본 후에 사진을 찾아보니 상상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더군요. 이 소설이 판타스틱에 연재될 때는 마지막에 사진이 공개되었다는데 책에는 안 실려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너스로 달아둡니다.


요독증과 신장염으로 사망은 1937년. (향년 26세)



